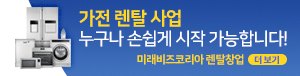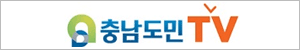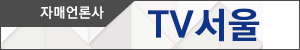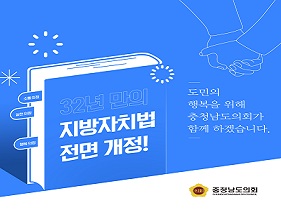|
2016년을 맞이하며 장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보다
우리사회에서 장애학의 흐름은 과거 정상인을 기준으로 하는 의료적 차원의 장애학 모델로부터 현대사회에는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를 개인의 특성으로 바라보는 견해로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 의료학적 기준모델은 향후 사회모델(social model)로 성장해 가야한다는 필요성은 1970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래 장애학의 새로운 변모로 등장하였다.
이것은 장애자들이 가지는 장애를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다 진보적인 인간관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독특성이 장애로 규정되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차원에서 보고자 하는 관점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자활 패러다임보다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보다 바람직한 모델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는 전인적인 재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의료적 재활, 심리적 재활, 교육적 재활, 사회적 재활, 직업적 재활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장애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즉, 과거의 능력주의에서 비롯된 정상인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주의적인 개념정의로부터 이제는 장애인을 사회의 한 소비자의 입장으로 보고 이들의 인권과 권리와 의사결정과 선택을 보다 존중하는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는 움직임과 목소리이다.
따라서 사회적이며 인권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관한 호칭이 과거 불구자, 기형아, 장애자, 장애우와 같은 호칭보다 장애인이라는 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호칭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건강한 개념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정신박약보다는 지적장애인, 귀머거리보다는 청각장애인, 농인(deaf), 벙어리보다는 언어장애자 의사소통 장애인으로 호칭 자체에서도 사회적인 존중이 밑바탕된 호칭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호칭 자체가 낙인(stigma)을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이중적인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동안 장애학은 탈 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상화(normalization)와 의료화의 개념에서 사회적 역할강화(social role valorization) 그리고 자립생활모델(independent living model)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 역시 향후에는 수요자 중심의 욕구를 존중하고 의사결정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고 이제는 다원적인 패러다임으로 장애인도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사회 및 문화적으로 인권의 존중을 받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장애인이 문화사회의 객체로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장애인이 정체성을 가지고 보다 주체적인 사회의 주권을 향유하는 계층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수렴될 때 우리나라의 장애학도 진정한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즉, 장애인은 기존의 사고와 같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문화, 장애정체성, 장애개성을 지닌 새로운 이미지로 정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장애문화는 사회적으로도 적극 권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잘못된 개념이 아니라 다름의 개념으로 수용되어져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자부심과 위엄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장애인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각종 장애 인식 역시 긍정적이고 평등한 개념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장애학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자와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관심이 촉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장애아동 그리고 장애인 가족에 관한 서비스와 실천현장의 변화가 수요자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